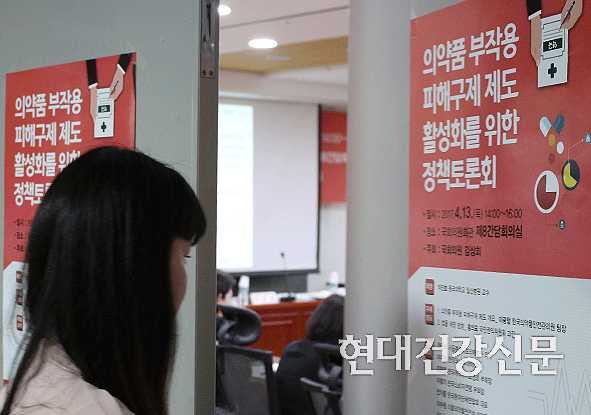상세 컨텐츠
본문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여전히 잘 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은 “제도 도입 3년째인 지금 사실 많은 국민들이 이 제도를 알지 못한다”며 “병을 고치려다 새로운 병을 얻은 환자들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어디에 어떻게 하소연을 해야 하는지 조차 모른다”고 말했다. 한 사람이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장에 들어서고 있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약을 먹은 뒤 뜻하지 않은 부작용으로 큰 피해를 입은 환자들을 보상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만들어진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제도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모든 의약품은 효과와 부작용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개개인의 체질 등 특성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제약사, 의사, 환자의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않은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입원치료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제약업체의 출연재원으로 정부가 그 피해를 보상하는 일종의 ‘사회 안전망’이다.
2012년 의약품 부작용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하 의약품안전관리원)이 설립되고 부작용 인과관계 원인 규명 등 전문적 심의를 위한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가 식약처에 설치된 것을 기반으로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식약처는 산학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약단체, 시민 환자 단체 보건의료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에서 논의를 마무리한 결과 2014년 12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피해구제 조사 처리를 맡고 식약처 산하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에서는 2017년 3월 현재 모두 64건의 보상을 결정했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인건비, 사업운영비는 정부 예산인 출연금으로 메우고 피해구제 보상금은 제약업체의 부담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제도가 시작된 2014년 12월 19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의약품안전관리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모두 124건으로 이중 ▲48건이 사망 ▲장애 6건 ▲장례 40건 ▲진료비 30건으로 나뉜다. 124건 중 85건은 심의를 완료했고 39건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제도 시행 3년 동안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124건으로 연간 40건, 매월 3.4건에 불과해 매년 수십 만건씩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 사고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숫자이다.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이광정 팀장은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의약품안전관리원의 협업이 중요하다”며 “자료 공유를 통해 중복 신청을 방지하는 등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의약품 부작용 신고가 2015년 20만 건에 육박해 10년 전인 2006년 2,400여건보다 무려 80배 넘게 급증한 상황으로 이는 인구 100만명당 발생건수로는 세계에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이다.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의약품안전관리원 이광정 팀장은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의약품안전관리원의 협업이 중요하다”며 “자료 공유를 통해 중복 신청을 방지하는 등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환자,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도 도입 3년째인 지금 사실 많은 국민들이 이 제도를 알지 못한다”며 “병을 고치려다 새로운 병을 얻은 환자들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어디에 어떻게 하소연을 해야 하는지 조차 모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도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며 “또한 환자들이 의약품의 부작용 때문인지, 의료사고인지 스스로 밝혀내는 것은 어려워 제도 개선을 통해 환자의 편의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서울시보라매병원 알레르기내과 양민석 교수는 “의약품 부작용을 의심하고 진단하는 것은 환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의료인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의사가 의약품 부작용을 진단하고 환자에게 알리는 경우 의사의 잘못이 없음에도 환자의 원성을 사고 법정 소송을 당할 수 있어 의사들은 부작용 진단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
양민석 교수는 “의약품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의사와 환자가 함께 내용을 공유하고 대책을 고민하는 분위기가 정착되지 않는 이상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약_건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노바티스 불법 리베이트로 '글리벡' 급여 정지 위기...환자 생명 위협 (0) | 2017.04.17 |
|---|---|
| 다발골수종 신약들 줄줄이 나오지만 환자들 ‘그림의 떡’ ...김기현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0) | 2017.04.17 |
| HIV 치료제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돌루테그라비르 (0) | 2017.04.14 |
| 기저 인슐린 란투스 바이오시밀러 '베이사글라' 국내 출시 (0) | 2017.04.14 |
| 황교안 권한대행 “차세대 의약품 통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 (0) | 2017.0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