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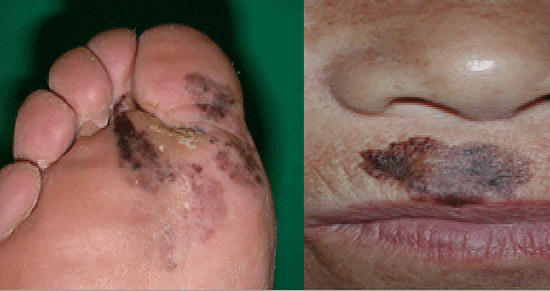

피부암학회 “표피 뚫고 진피까지 암세포 퍼지면 전이될 수 있어”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피부암이 습진과 모양이나 병변이 비슷해 진단이 늦어지거나 오진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만여 명이었던 피부암 환자가 2013년 1만5천여명으로 증가했다.
대한피부과학회는 피부암 환자 증가 요인으로 △인구 고령화 △자외선 노출 증가 등을 꼽고 있다. 하지만 백인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피부암은 한국에서 여전히 ‘희귀한’ 암이다.
대한피부암학회(피부암학회) 정기양 회장(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은 "대표적인 피부암인 흑색종 환자가 매년 500명 정도 발생하지만 작은 규모의 병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들은 4년 동안 환자를 한 명도 못 볼 가능성이 높다'며 "전문의도 피부암을 경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발생 빈도가 다른 암에 비해서 적은 피부암이 가장 흔한 피부질환인 습진과 양상이 비슷해 오진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피부암학회 윤숙정 학술이사(전남대병원 피부과 교수)는 "피부암을 진물이 나는 습진 정도로 진단하는 경우가 있다"며 "조직검사가 늦어지며 습진이나 양성조양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피부암이 손발톱 밑이나 성기에 발생할 경우 진단은 더욱 어려워진다.
20일 중앙대병원 동교홀에서 열린 피부암학회 심포지엄에서 삼성서울병원 피부과 이동윤 교수는 "손발톱 종양들은 대개 손발톱판에 덮여 있어 피부에 발생하는 종양과는 양상이 달라 악성과 양성을 감별하기 쉽지 않다"며 "흑색종은 임상적으로 대부분 세로선 흑색손발톱을 보이는데 진행될 경우 예후가 좋지 않아 조기 진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피부 표면에서 번지는 피부암의 경우 비교적 치료가 쉽지만 암세포가 표피를 뚫고 진피로 들어가 뼈나 림프절로 전이가 되면 치료가 힘들어진다.
정기양 회장은 "습진이나 곰팡이 정도로 진단받고 조직검사를 하지 않은 채, 몇 년씩 바르는 약만 쓰다가 상태가 악화돼 대학병원을 찾는 경우가 있다"며 "손발톱 밑이나 성기에 발생하는 피부암은 진단이 잘 안 돼 장기간 진행되거나 재발한 환자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위험하지 않다는 사회적 인식이 ‘여전한’ 피부암은 민간보험에서도 홀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으로 진단받은 경우 본인 부담이 5%로 줄어 경제적으로 부담이 줄지만 민간보험의 경우 일부 피부암을 보험상품에서 제외하거나 암으로 취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암보험 가입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정 회장은 "피부암 중에 기저세포암은 아주 많이 진행되지 않을 때까지 전이가 없어 암인지를 놓고 논란이 있다"며 "이런 이유로 일부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피부암 중 흑색종은 다른 종류의 암과 필적할 정도로 악성도가 높아 보상이 필요해 보험사 기준이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건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건강관리협회 채종일 회장 "120세 실현 위해 건강증진 활동 강화" (0) | 2016.02.22 |
|---|---|
| [포토] 차병원 서울역 난임센터 개원...최신 수정난 인큐베이터 선보여 (0) | 2016.02.22 |
| [포토] 차병원 서울역 난임센터 개원...개원 의미 설명하는 차광렬 회장 (0) | 2016.02.18 |
| A형 독감 환자 급증...38℃이상 발열 시 의심해야 (0) | 2016.02.12 |
|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20대 강박장애 시달려 (0) | 2016.02.09 |






